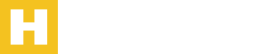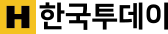산과 바다.
어느 쪽이 더 좋고, 어느 쪽이 더 나쁜가? 이러한 물음처럼 어리석고 아둔한 질문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나는 '인자요산 지자요수'의 신봉자다. 최고운은 만년에 가야산 깊은 곳에 들어가 선화를 하여고, 모파상은 늘그막에 지중해를 맴돌며 끝내 사람을 생각했다고 한다.
인류의 성자들은 거의가 큰 산, 깊은 숲 속에서 큰 깨달음을 입어 인류의 새로운 목숨을 얻었고, 자연에 도전했던 문명의 개척자들은 바다와 싸우며 문명의 지평선을 넓혔던 것이다. 그래서 산은 과거가 긴 사람에게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바다는 미래가 긴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것 같다. 전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위 수직민족이요, 후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른바 수평민족이다.
나는 어려서 톱니처럼 들쑥날쑥한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서 자랐다. 그러나 바닷가에 나가는 시간보다 낮은 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소를 뜯기러 산자락을 맴돌거나 꼴이나 더러는 갈퀴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곤 했는데, 꼴베기나 갈퀴나무하기가 싫으면 동무들과 산곡대기에 올라 해가 지도록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웠다.
바다는 한없이 넓고 넓었다. 바다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있었다. 그것이 수평선이라느 것도 모르고, 외 폭 짜리 두 폭 짜리, 세폭자리 범선ㄴ들이나 기선(윤선)들이 그 속으로 사라지는 것만 보았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 배들이 가라 않았다거니, 우리의 눈(시력)이 나빠서 안 보인다거니 우김질을 하였다.
바닷물이 들고 난 것도 달의 인력 대문이란 것도 모르고 큰 고래떼들이 물을 들이마시면 물이 나고(간조), 다시 내어 뿜으면 물이 든다(만조)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해가 지면 꼴 몇 주먹을 베어서 망태에 담아 오거나, 갈퀴나무 몇 깍지를 지게에 지고 오면 망르 할아버지들은 "야, 이놈들아 그런 풀을 소가 먹겄냐? 니밑천만큼 베어도 소가 먹는 풀을 베어야지. 응 쯧쯧......,"하는가 하면 할머니들은 "아그들아, 그 가치집 다 문진다."고 아타까운 표정들을 지었다.
산과는 이처럼 가까웠지만 바다와 직접 접하는 기회는 적었다. 우리 마을과 가까웠던 바다-지금은 간척지가 되었다- 는 개펄만 드러낸 짱둥이 운동장이었기에 해산물이라곤 고작 짱둥이-그때는 먹지도 않았다-나 갈통게, 청단게, 잔게가 고작이었다.
어쩌다 1년에 두어 번 개막이란 것이 들어오면 마을 남정네들은 발, 그물, 가래 등을 가지고 가서 눈갓이 노란 숭어나 모치,길이가 한 발이나 된느 장어, 방석처럼 넓적한 간재미나 가자미, 명태만한 무조리, 그리고 꽃게 등을 망태가 뭍힘하도록 잡아와서 혹은 배를 따서 추석 찬감으로 말리기도 하고 혹은 손재 없는 이웃집에 돌리기도 하였다.
우리 또래는 멋도 모르고 어른들의 앞장을 섰지만 희 무명옷에 뻘만 범벅이 되도록 뭍혀서 어머니들의 빨래감만 늘여 놓았다. 이 것이 나의 바다와의 인연이었다.
그 후 수학하던 시절이나 직장생활은 바다와는 먼 공간에서 하게 되었다.
때때로 여행을 통해서 바다의 면모를 엿보앗지만 바다를 본격적으로 본 것은 2년 6개월간 k섬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였다.
바다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표현과 같이 하늘은 하늘이요 바다는 바다라고나 할까.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늘과 바다뿐인 공간에서 그 넓은 신비화 비의 밖에 말할 것이 없다.
어느 작가는 봄의 바다는 성난 파도가 가라앉은 잔물결 위에 자장가 처럼 내리는 세우의 달램으로 깊어가며, 여름의 바다는 먹구름이 몰고 온 취우로 고도치며, 가을의 바다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 사자처럼 포효하는 바다가 있는가 하면 여인의 숨결처럼 결고운 바다가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신열을 앓고 있는 바다가 있는가 하면 찬란한 햇빛 아래 보석처럼 반짝이는 바다가 있다.

마음이 전율하는 바다가 있는가 하면 별들이 타주하는 바다가 있고, 생명의 훈향이 넘치는 바다가 있는가 하면 죽음의 칼날이 번쩍이는 바다가 있다. 그 넓은 바다, 그 신비와 비의 원형의 원형으로 밖에 말할 길이 없다.
심리학자 융 박사는 ' 종교의 상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은 원' 이라고 했다. 내가 태평양 한복판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동이나 서나 남이나 북이나 위나 아래나 육합이 둥근 수평선 밖에, 둥근 원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사람의 머리로 풀다가 풀다가 풀리지 안흔 것이 신비라고 하며 그 신비는 우리 정신의 원형이며 곧 우리의 종교가 되는 것이다.
바다는 둥글다.
우주도 둥글고 지구도 둥글고 일월성신 모두가 둥글다. 움집도 둥글고 인디언이나 몽골인의 천막도 둥글고 독수리집도 둥글고 찌르래기집도 둥글고, 아도 둥글다 태아도 둥글다.
플라톤은 사람은 불완전한 반쪽으로 태어나서 다른 반쪽(배우자)과 결함(혼인)해야 완전한 인간(둥근 인간)이 된다고 했다. 공간만 둥근것이 아니다. 시간도 둥글다. 서구인들의 물리적 디지털 시간관은 직선이지만 우리들의 순환적 아나로그 시간관은 둥글다.
수평선 너머 기항지를 돌고 돌아 끝내느 모항으로 돌아온 것도, 우리의 날숨과 들숨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의 변화도, 밀물과 썰물도 순환의 시간이다. 그래서 순환은 우주의 리듬감이요 생명인 것이다.
바다는 원형이요 원형 원형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