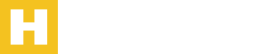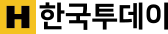신간 <벌목 당한 기억 사이로>가 출간되었다.
눈을 뜨면 늘 간밤의 욕망이 헹궈진 아침의 소리처럼 제 삶 다하고 사라졌던 시간들의 그 신비한 에너지를 담은 수필집이다.
욕망의 전생이 저자를 지상에 불러왔다. 저자는 댓잎 같던 청춘을 노래와 연기로 혹사시키면서 시간을 보냈다. 청춘의 일몰 시간에 시라는 인연을 만나 등떠밀듯 바람의 화첩을 그리려고 붓 하나를 잡아 들기 시작했다.
시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세로서 시를 이야기한 <플각시 뜨락>에 지나온 시간들을 시집으로 비우고 버렸으며, 저자는 버려진 몸을 힘들게 다시 이어 이 수필집에 청춘을 묶었다.
그것들이 며칠 혹은, 몇 달씩 닻을 내리고 사유의 굽은 등성이에 따개비처럼 증식하며 자아의 입자들을 무한정 휘젓고 있다. 이제 갓 피어난 사유의 물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물꽃 위로 겹겹 떨어지는 기호의 빗방울들은 몸 버릴 곳 몰라 <벌목 당한 기억 사이로>에 글 한 줄 남겨두게 된 것이다.
혁명을 기대했던 햇살이 냉정하게 제 갈 길 가듯 몸 버리고 갈 줄 알았더니 몸 데리고 간다고 말하고 있다. 한 시절의 다리를 건너간다는 것이 때로는 까실한 생의 사포질에 뼈까지 갉아먹히는 듯하다고 표현한다. 수면 위에 눈물 한 잎 새기는 일처럼 아득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벌목 당한 기억들이 먼 훗날 누구의 잎새가 되든 고뇌에 동참한 인생들이 있다. 아낌없이 남은 시간의 소중한 기억을 새로 담으며 이 책으로 잠시 쉬어 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