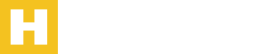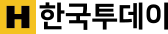내가 태어난 해가 1957년이니까 6.25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아버지는 가족을 모두 북에 두시고 홀로 월남 하시어 일가친척도 없고, 한 평의 땅도 없는 상태였다. 내가 태어났던마을에 한 분이 농사를 지으라고 밭 500평을 무료로 주신 것이 계기가 되어 용인에 정착하게 되셨다고 한다. 아버지가 그곳에 정착 하시다보니 나의 고향이 된 것이다.
고향마을에서 한 마을에서만 두 번을 이사를 했으니 고향마을에 우리가 살던 집은 세 채나 있었다. 한 채는 우리가 그 마을에 살고 있을 때 이미 헐렸고 나머지 두 채는 우리가 고향을 떠난 후에 헐렸다. 그래서 지금은 고향에 내려가도 내가 살았던 집의 모습을 볼수 없다. 집터도 돋우고 파내고 하여 어릴 때 내가 살았던 곳도 찾기가 쉽지가 않다. 전에는 고향에 내려가면 여기가 내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치곤 했는데 지금은 모양이 변하여 여기쯤이 내가 살던 집이 있던 자리인데 하는 생각이 들 뿐이 다. 아이들과 고향을 내려가면 여기가 아빠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라고 말한다.
아버지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림을 꾸려나가시고 자식들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하시다 보니 술 한잔도 마음대로 드시지 못하시고 사셨다. 그러다보니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동네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기회가 적다보니 아버지는 때로는 따돌림을 받으시기까지 하셨다.
따돌림을 받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어린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당시 동네 아이들 중에는 잘 살면서도 초등학교까지만 보내고 중학교는 보내지 않는 집이 많았다. 나도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공부를 하기보다 책가방을 팽개치고 먼저 일을 해야 했다. 여름 철에는 쇠풀을 한 짐 베어 와야 했고, 겨울철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 와야 했다.
친구들과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지게에 지고 내려와야 하는데 나는 키가 작고 지게질이 서툴러 비탈길을 잘 못 내려오니까 비탈 길에서는 친구 중 영철이라는 친구가 자기 짐을 먼저 내려다 놓고내 짐을 대신 내려다주곤 했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나를 고등학교까지 진학시켰고 대학에도 보내겠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아무리 바쁘더 라도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셨다.
내가 태어나고 초등학교 때까지 살던 집은 개나리 울타리에다 하천변으로는 참죽나무들이 있었다. 울안에는 감나무와 고염나무, 앵두나무가 있었다. 두 번째로 살았던 집은 함석집으로 소낙비가 오면 비오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여름이면 무척 덥고, 겨울이면 무척 추웠다. 겨울에 방안에 앉아 있으면 방바닥은 뜨거워도 손이 시릴 정도로 추웠다. 집 앞쪽 울타리는 개나리 울타리였고 뒤쪽은 보리수나무 울타리였다. 뒤쪽 울안에는 양딸기, 앵두나무, 대추나 무, 감나무, 고염나무, 포도나무가 있었다. 울타리 밖으로는 중간 중간에 밤나무, 개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드릅나무 등이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제철 과일들은 거의 맛 볼 수가 있었다.
30여 가구가 살던 고향마을에서 십리나 떨어진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동창생이 남자 5명, 여자 7명 모두 12명이나 되었다. 난 여자애 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지만 남자 친구들과는 자주 어울렸다. 함께 어울리며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를 했고, 술래잡기 놀이도 했다.
어릴 때는 윗말부터 아랫말까지 30여 호가 넘었으나 지금은 헐린 집이 많아 고향에 가도 어릴 때 살던 때의 향수를 느낄 수가 없다.
그나마 있는 집들도 어릴 때에 있었던 집들을 허물고 새로 짓다보니 어릴 때의 정취는 찾아보기가 더 힘들다. 지금은 논도 경지정리 되었고, 농사일도 기계화 되어 소로 논밭을 가는 일도 없고, 손으로 모내기 하는 것도 찾아 볼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까지는 기계화 되지 않아 소를 이용하여 논밭을 갈아야 했고, 모내기는 손으로 해야 했다.
초등학교는 집에서 십 리도 더 되는 거리에 있었지만 걸어서 다녔다. 교실이 부족해서 저학년 때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공부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학교에 오가다가 봄에는 이름 모를 풀뿌리를 뽑아 먹기도 했고, 딸기를 따 먹기도 했다. 요즈음에는 산에 가서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그때는 산에 가면 각종 버섯들이 많이 있었다. 청버섯, 꾀꼬리버섯, 싸리버섯을 따다가 독사에 물릴 뻔했던 적도 있었다.
버섯의 윗부분이 밤색 모양의 다발로 된 참나무 버섯은 참나무를 베어내고 썩은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버섯이었는데 너무 흔하고 지천으로 깔려 있어 쳐다보지도 않았었다. 맛은 참으로 좋았는데 너
무 흔하다 보니까 아예 먹는 버섯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 흔하던 버섯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어릴 때 생각이 나서 늦은 봄이나 여름에 비온 다음날 고향에 내려가 버섯이 많이 나왔던 야산에 올라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흔하던 참나무 버섯을 이제는 구경을 할 수가 없다.
작은 학자골, 큰 학자골, 장작터, 안개울에 가서 가재나 미꾸라지를 잡는 것도 참으로 재미있었다. 지금은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되어 잡을 수 없지만 당시에는 개구리가 지천이었고, 개구리를 잡아 뒷다리를 뽑아 구워먹기도 했고 돼지 먹이로 주려고 친구들과 어울려 개구리를 잡으러 다니기도 했다.
봄에는 사슴벌레나 가재를 잡으러 다니거나 벚나무에 올라가 벚을 따먹고 뽕나무 밭에 들어가 오디를 따먹기도 했다. 오디나 벚을 먹으면 혀나 입술이 까맣게 물들어 표시가 난다. 여름에는 나무딸 기를 따 먹기 위해 들판을 헤매고 돌아다니기도 했고, 하천에 가서 벌거벗고 미역을 감기도 했다. 들에 나가셨던 아버지께서 딸기가 많이 달린 딸기나무를 베어 오셔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셨다.
지금은 농약으로 거의 보기 힘들게 되었지만 당시 가을에 논에 나가면 어디를 가나 메뚜기가 참으로 많았다. 들판에 나가서 메뚜 기를 잡아 병에 담거나 강아지풀에 꿰어 집에 와서 기름에 볶아 먹으면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다. 학교에 오가는 길옆 밭에 심어 놓은 무나 고구마를 캐서 입에 물고 다니거나 밤나무 밭에 가서 몰래 밤을 따오기도 했다. 지금 그랬다가는 바로 절도죄로 입건되겠지만 그때는 설사 들키더라도 눈감아 주는 시절이었으니까 가능했는지 모른다.
겨울에는 곡괭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 칡뿌리를 캐어 먹거나 화롯 가에 둘러 앉아 밤이나 고구마, 감자를 구워 먹으며 놀았다. 설날이 지나면 누구네 집에 가더라도 떡이 있고, 수정과나 식혜가 있었다.
어릴 때는 친구들이 우리 모두 고향을 떠나지 말고 고향에서 재미있게 살자고 굳게 약속을 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지에 있는 학교로 가는 친구, 군에 입대하는 친구, 직장을 찾아한 명 한 명 고향을 떠나기 시작하여 지금은 고향에 살고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다.
고향에 친구들만 없는 게 아니라 함께 살던 원주민들도 한 사람한 사람 고향을 떠나가기 시작하여 토박이들은 거의 마을을 떠나 빈집이 생기기 시작했고, 빈집은 헐리고 마을 사람들도 많이 줄었 다. 그나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외지인들이다.
고향을 떠나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집이나 찾아가서 밥 한끼를 얻어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는 사람이 사는 집에 찾아가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친구들과 함께 고향에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갖다 놓고 고향에 가면 부담 없이 하루 밤을 자고 올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향이 고속도로가 있어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다 보니 기차를 타볼 기회도 없었다. 그래서 고향에 살 때 친구와 함께 단지 기차를타보자며 부산까지 내려갔다 왔던 적도 있다.친구들은 고향을 떠났어도 내가 고향에 있을 때는 명절에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만날 수 있었지만 나마저 고향을 떠난 이후에는 고향에 가더라도 친구가 사는 집이 아니고 친구의 형이나 형수님이 살고 있고, 처갓집에 가야하는 등의 이유로 친구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산소에도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명절날 내려가지 않고 전 주에 다녀온다. 친구들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애경사가 있을 때나 만날 수 있지 다른 때는 만나기가 어렵다.